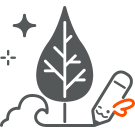다른 명령
새 문서: {{PortInfobox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 좌표 =북위 35° 02′ 00″ 동경 128° 47′ 00″ | 개항 =2006년 01월 19일 | 종류 =무역항 | 항내수면적 =약 8,670,000㎡ | 항만 해안선 =45㎞ | 항만 수심 =16~20m | 조차 =1.5m | 기본계획 기간 =1995.12.20 ~ 1997.08.30 | 기본설계 기간 =1997.09.01 ~ 2000.12.31 | 실시설계 기간 =2001.01.01 ~ 2002.06.30 | 공사기간 =2002.08.10 ~ 2025.12.31 | 타당성조사 =... |
편집 요약 없음 |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BPA) | |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BPA) | ||
| 소관 정부부처 =해양수산부 | | 소관 정부부처 =해양수산부 | ||
}} | |사진=부산신항.jpg}} | ||
== 개요 == | == 개요 == | ||
2025년 6월 24일 (화) 05:22 기준 최신판
개요
부산신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는 대규모 국제무역항으로, 기존 부산항 북항의 물동량 포화와 시설 노후화를 해소하고자 건설되었다. '부산항 신항'은 기존 신항과 제2신항(진해신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공식 영문명은 Busan New Port이다. 2022년 기준 전체 부산항 물동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40년 완공 시 세계 3위권 메가포트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칭과 위치
- 명칭: 부산신항 / 부산항 신항 / 진해신항 (영문: Busan New Port)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행정구역: 북컨테이너터미널은 부산(40%)과 경남(60%) 분할 관할, 나머지는 각각 해당 시도 관할
- 공식 문서: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병기 사례 증가
개발 배경 및 역사
- 19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 1997년 10월 착공, 2006년 3선석 개장 후 순차 개발
- 2020년까지 3단계 개발 완료, 제2신항은 2024년 1-1단계 공사 발주(2029년 준공 예정)
- 사업비: 총 16조 6,823억원 규모, 항만자동화 및 글로벌 환적 경쟁력 확보 목적
주요 특징
- 세계 2위 환적항, 세계 7위 물동량 항만 (2022년)
- 기존 신항(제1신항): 북·남·서 컨테이너 부두 포함, 24선석 운영 중 (총 57선석 계획)
- 제2신항(진해신항): DL-23m 수심, 400m 안벽, 완전 자동화 부두, LNG 벙커링 및 수리조선 클러스터 포함
- 부산항만공사가 모든 부두 운영 총괄
운항 계통 및 정차역
- 해당 사항 없음 (항만 특성상 철도와 달리 정차역 구분 없음)
차량 및 기술 사양
-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2024년 개장)
- 대형 컨테이너선 13,250TEU급 접안 가능
- 안벽 총 연장 14.71km (최종 45개 선석 개발 예정)
- 각 터미널: BNCT, HPNT, PNIT, PNC, HJNC 등
교통 및 연계 인프라
-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제2·3지선, 중앙고속도로지선(예타면제)
- 철도: 부산신항선 (화물 전용)
- 공항 연계: 가덕도신공항과 약 15분 거리, 접근철도 연계 추진 중
- 대중교통: 매우 제한적, 자차 출퇴근 필수적 환경
수요 및 운송실적
- 부산항 전체 물동량(2022): 22,078천 TEU
- 부산신항 처리 비중: 약 70%
- 진해신항 완공 시: 3,700만 TEU 처리능력 예상
운영자 및 경영 정보
- 운영 주체: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산하)
- 주요 운영사: 부산신항국제터미널, 현대산업개발, PNC, HMM 등
- 민간 및 정부 사업 병행, 공공성과 경쟁력 조화 시도
기타 사항
- 2020년 Milano Bridge호 크레인 충돌사고 발생
- 2022~2023년: 특수경비원 열악한 처우, 무기 훈련 미이행 등 논란
- '신항~진해신항' 사이 항만 부지 추가 개발(2024.6. 발표)
기술적·엔지니어링적 의미
-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매립형 항만 개발 사례
- 완전 자동화 부두 및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선도
- 대형 선박 접안 및 물류 클러스터 집적, 글로벌 해운 허브 기능 확보
- 육상 교통망(도로, 철도, 공항) 연계를 통한 복합운송 체계 구축